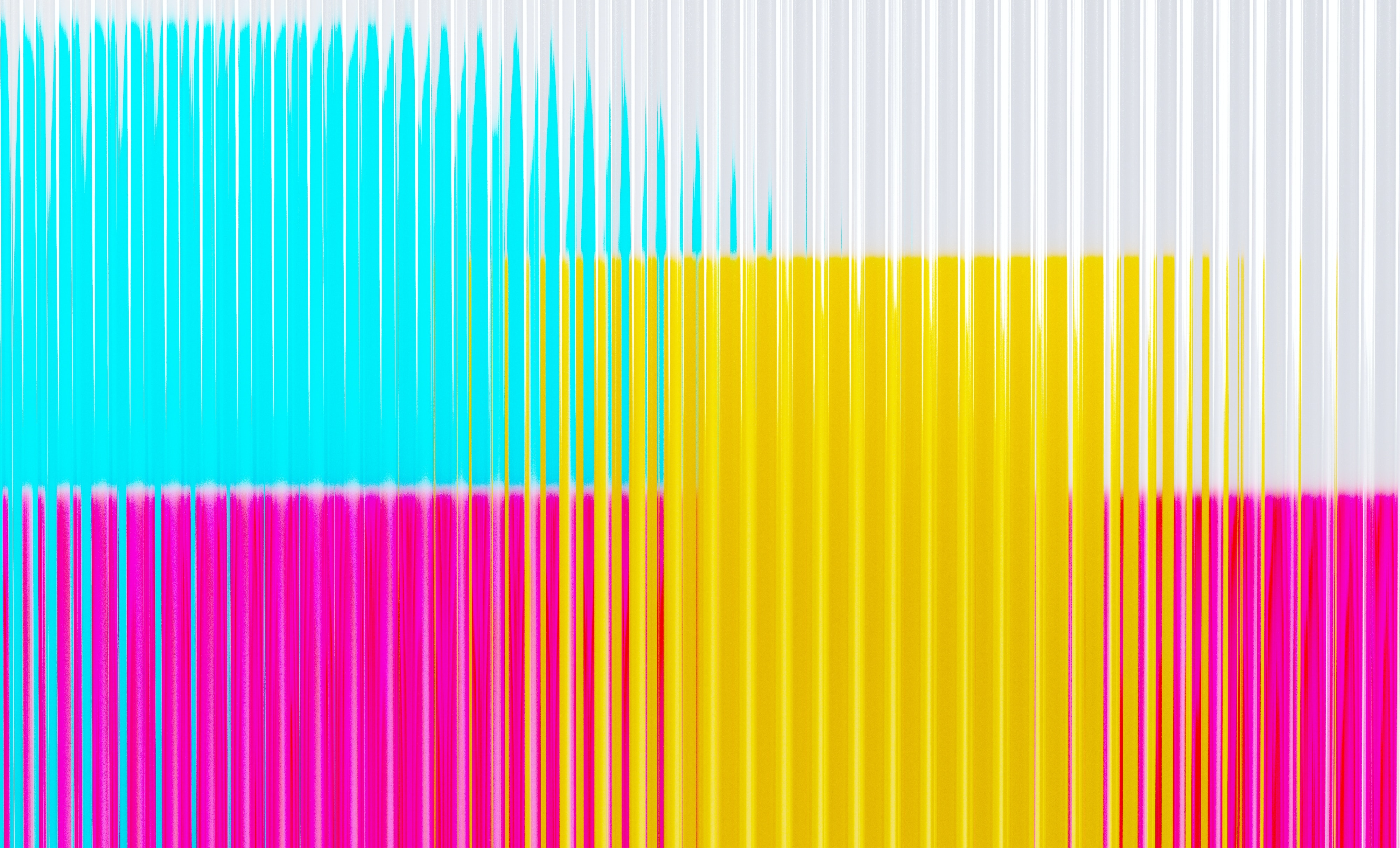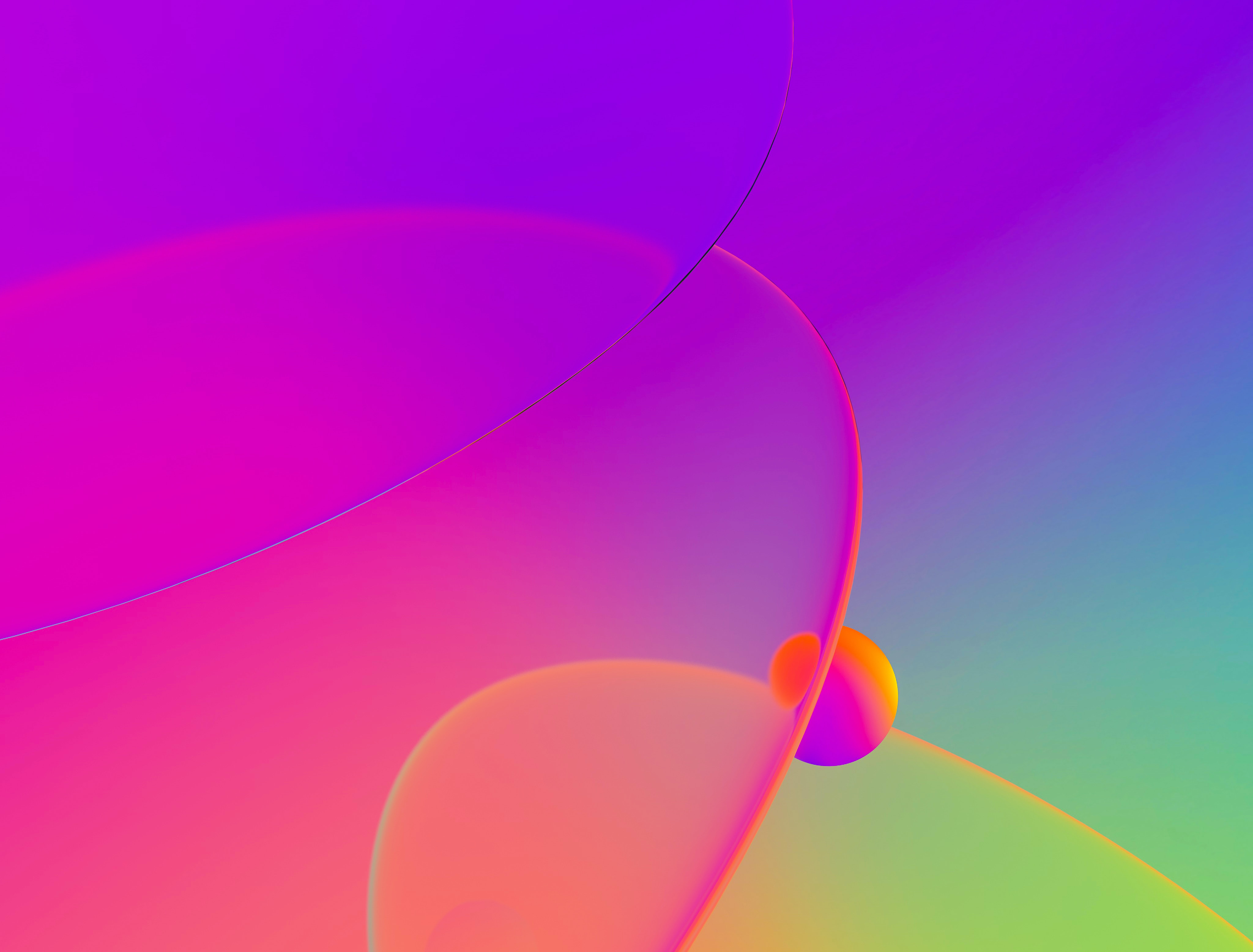!!당연하지만 스포일러 한 가득이니 안 읽은 사람은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길 바람.

엄청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정세랑 작가 장편을 읽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 드라마로만 봤었는데, 책에서는 러브라인이 나온다길래 굳이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
SF적인 요소가 있다고해서 김초엽 작가의... 뭐더라... 아무튼 첫 장편 소설이랑 고민하다가 그냥 이것만 빌려왔다.
1.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작가가 누구냐고 묻는 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를 꼽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에서야 이 작가의 글을 처음 읽었다만.... 아무튼 이번 독서로 왜 이 작가가 널리 읽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일단 소재가 참신한데 호, 불호를 크게 타지 않는 소재에다가 문장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쉽게 읽힌다. 내용 전개도 독자가 따라가는데 크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없는 수준. 게다가 짧기까지 하다.
2. 소설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일단... 지구를 자꾸 별이라고 하는 데서... 자꾸만 책을 덮고 싶어졌다. 이 부분은 정말 덕후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지구는 별이 아닌데. 작가가 원래 SF류의 책을 많이 쓰지 않았다거나 평소 천문학이나 물리 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건 알겠다. 기억에 남는 다른 부분을 또 꼽자면 주인공 한아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너무… 2000년대 중 후반 즈음의 ‘난 달라’ 감성이라는 점. 이건 작가 후기를 보니 10년 도 더 전에 쓴 소설을 수정한 거라고 해서 어느정도 납득하게 되었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그때 그 시절 홍대 히피 감성을 현대에 어울리게 조금씩 수정한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친구네 부부의 임신소식과… 그걸 굳이 해명하고 설명하는 장면 -더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본 듯한 밈까지-이 나온듯. 아무튼간에 글 읽는 내내 분명 다루는 이슈는 시류에 부합하는 것들인데 묘하게 예스러워서, (적어도 나에게는) 작가가 의도한 캐릭터성과 내가 실제로 느낀 것 간의 괴리가 상당히 컸다.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알겠지만 난 그렇게 느낄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다른 등장인물은 문제의 아이돌 팬이다.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작가는 이 인물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어떤 감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소위 ‘빠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꿈과 낭만을 좇는 사람으로 다루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낀 걸까. 난 그냥 이런 주제는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면 아예 안 건드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단순히 ‘이런 삶도 있다’는 의도였을까? 정말 그런 단순한 목적이었다면 좋은 방식은 아니었던듯 싶다…. 그 국정원 직원도 비슷하다. 혼자 붕 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퇴장해버리기까지 하는데 초기 구상에선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글을 다듬은 뒤에도 남아있어야만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엑스…. 나는 정말 2023년에 이런 인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소설 자체는 2019년에 출판되었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초고는 거기서 10년도 더 전에 쓰였으니 한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안다, 아는데도… 너무 힘들었다. 셀프 웨딩 준비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세상의 끝에 가보니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그걸 아는게 나한테 가장 중요 하다는 걸 깨달았어, 자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입맞춰 주겠어? 네…? 이게 뭐죠…? 이런건 구식 사랑법이라고 명명해서도 안 된다. 나는 아직도 길상이가 마음 속으로 정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애리는 감성 충만한 사람인데. 이건 예스러운게 아니라 구질구질 한거다. 아니 원래 사람 마음이 구질구질하긴 하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쿨하게 끝내는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도 좀 더 세련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나도 내가 쓰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데. 지구 어딘가엔 내가 느낀 감정을 말로 제대로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거라 믿으며 여기서 그만 줄이겠다.
3. 호평은 칭찬 일색이고 혹평은 아주 치를 떨던데 왜 그렇게 감상이 갈리는지 이해가 간다. 평소 SF같은 장르문학을 자주 보고 장르 문법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 소설이 소재를 차용하고 전개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결말에 가서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다. 글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그 겉치레로 끝난 ‘SF스러움’이 좋았을 거고. 나는… 작가의 글이 취향이 아니니 앞으로 굳이 찾아보진 않을 듯 하다. 소재 자체는 유쾌한 구석이 있어 나쁘지 않았다만. 아 맞다, 읽는 내내 영상화하기 참 쉬운 글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