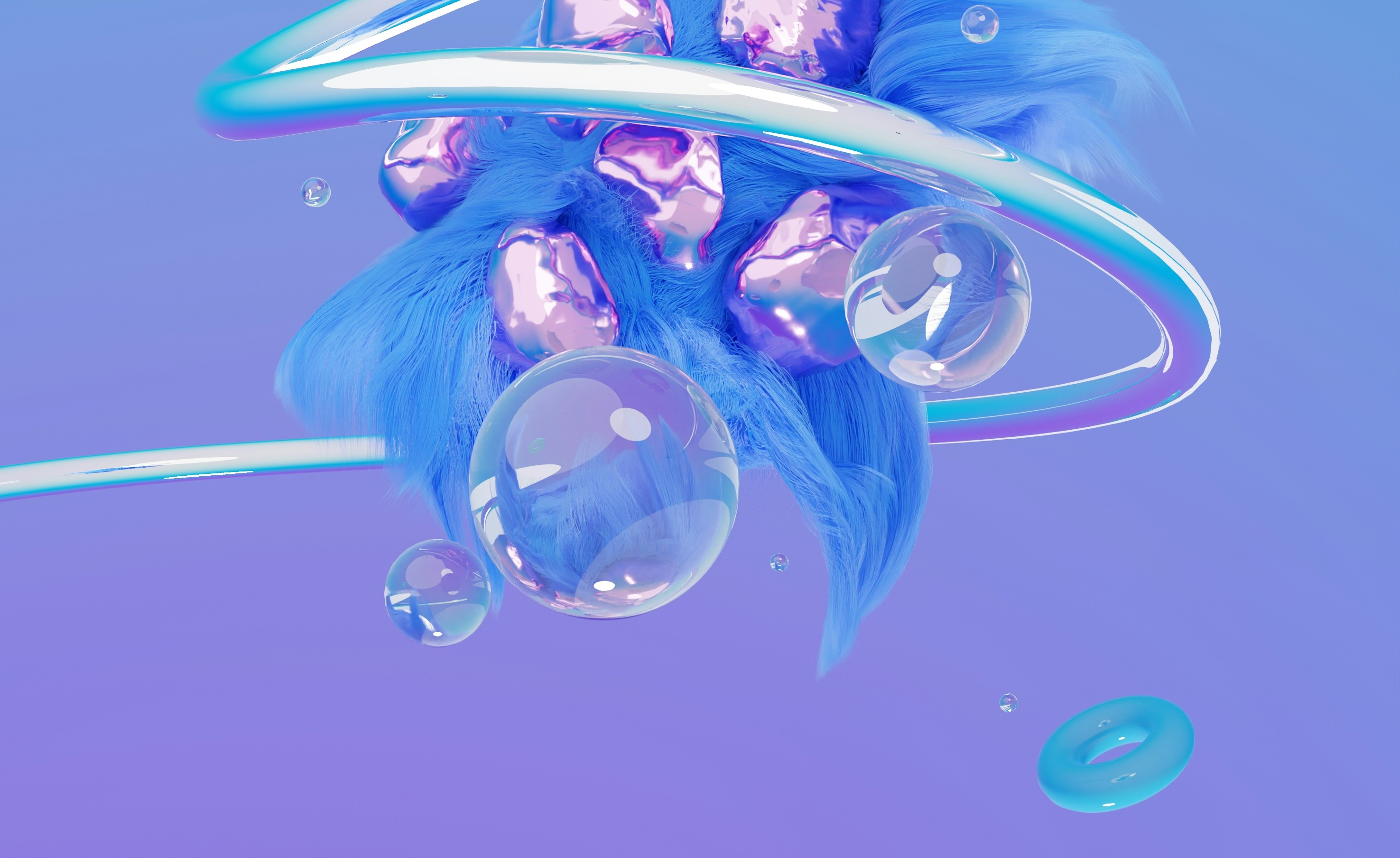!!스포일러 유의
1.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읽고 자연스럽게 키르케를 읽게 되었다. 같은 작가가 비슷한 소재로 쓴 책, 근데 주인공이 여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중반부 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정말... 내 취향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추하는 책은 아니고. 재미 없는 책은 아니다, 재미있는 책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의도한 감동이 나한테는 별 감흥 없었다는 것. 후반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는 것일 뿐이다.
2. 초반에 키르케 족보가 나오는데 나는 전혀 모르던 사실이라 꽤 놀랐다. 키르케가 헬리오스의 딸이고 형제자매로 파시파에. 페르세스, 아이에테스가 있다는 걸 이번에야 알았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나올 때 쯤이 되어서야 내가 칼립소랑 키르케를 한 인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뇌가 고장난 걸까? 만화로 읽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어릴 때 그렇게 읽어 놓고는...
3. 후반부까지 읽고 있자면 이제는 촌스러워서 아무도 쓰지 않는 철 지난 유행어가 하나 생각 난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사어인데...ㅋ 작가가 나이가 꽤 많고 남편에게 매번 책의 첫머리에 헌사를 바치는 사랑꾼...인 걸로 보았을 때 그냥 어쩔 수 없는 전개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간이 되어 텔레마코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고, 함께 기르고, 나이먹고 죽는 예언을 볼 때 정말 끔찍한 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작중에선 이게 해피 엔딩이라니...
조카 메데이아에게 '외로움이 코를 찌르는 애처로운 추방자', '비참한, 버림 받은 할망구, 메데이아의 생기를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거미', '무자식으로 지내는 산송장같은 삶'같은 모욕을 면전에서 들었을 때 후반에서 키르케의 삶으로 이 모욕이 모욕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둘 낳아 키르케의 삶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살지만 결국 본인 손으로 그 둘을 없애버리고 그 삶에서 탈출해버리니까. 이 장면은 앞으로 키르케의 삶이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키르케가 무한한 불멸의 삶을 어떤 식으로 조리할지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키르케는 메데이아의 모욕을 벗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나면 애를 낳아서 '헐 나 무자식 아님~'으로 이 오명을 벗는다. 그리고 나중엔 나만의 벤츠 남친 텔레마코스를 사귀어 행복하게 살아서 또 한번 저 욕에서 벗어난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4. 그냥... 혼자 잘 살면 안 됐던 걸까? 전승이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는 말론 반박이 안 된다. 작가는 여러 전승 중 한 가지를 취사선택해서 각색을 했으니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반부 임신, 출산, 육아 장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인터넷에 후기 검색해서 건너 뛰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키르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오디세우스를 죽이는 전승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충격적일 정도로 뜬금 없었고 지루했다. 매사 천방지축인 아이(솔직히 그리 똑똑해보이지도 않았다. 키르케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를 보면서 키르케가 느끼는 애틋함과 사랑, 조건 없는 헌신에 공감이 안 가고 그냥 자식 하나 잘못 낳아서 개고생한다는 연민만 들었다. 왜 키르케는 피임약을 스스로 끊었을까? 오디세우스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으니까? 다르긴 달랐지.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텔레마코스도 마찬가지고.
5. 그나마 페넬로페가 등장하고 나서부턴 재밌어졌다. 오디세우스 인생 후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재미있기도 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경멸하는 티를 은근히 내는 게 흥미로웠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뱃길을 나서는 아들보다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무기력함을 학습한 아들이 더 현실적이어서 그런가? 투기하지 않고 항상 수를 짜내는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에 짓눌린 페넬로페도 좋았고. 아무튼간에 오디세우스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페가 후반부 재미를 이끌었다.
6.
"부탁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는 게 싫어요. 진심으로. 농담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가 말했다. "농담일 리가 있나.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상상력을 동원해봐. 걔네들도 뭔가 쓸모가 있을 거 아냐. 침대로 부르면 어때?"
"말도 안 돼." 내가 말했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칠 걸요."
"님프들은 원래 그래."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 걔네는 도망치는 데 젬병이야."
님프들이 내 주변에서 맴돌았다. 숨죽인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나마 그들의 형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형제였다면 으스대며 서로 싸우고 내 늑대들을 잡으러 다녔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었다. 아들들은 절대 벌을 받지 않았다.
님프들은 신부라고 불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우리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름답고 늘 새롭게 바뀌는 진수성찬이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데 영 젬병이었다.
7. 아쉬운 점만 잔뜩 썼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책이다.
초반과 중반을 이루는 이야기가 정말 좋았다. 시사하는 부분이 많기도하고 할 이야기도 많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괴물을 낳기로 선택한 파시파에나, 얼핏 다정해보이나 누구보다 키르케에게 냉담한 아이에테스나, 다른 자매와는 다르게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헬리오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펠레스, 글라우코스, 외롭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키르케를 귀신같이 가지고 노는 헤르메스 등... 그래서 후반부 이야기가 더 실망스러웠던 것같다. 읽으면서 기대를 점점 키워갔는데 작가와 내가 생각한 종착지가 서로 달랐다. 그래도 읽어서 후회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